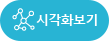| 항목 ID | GC07600560 |
|---|---|
| 한자 | 誡初心學人文-諺解-木板 |
| 영어공식명칭 | Printing Woodblocks of Gyechosimhaginmun |
| 영어음역 | Printing Woodblocks of Gyechosimhaginmun |
| 영어공식명칭 | Printing Woodblocks of Gyechosimhaginmun |
| 이칭/별칭 | 초발심자경문 |
| 분야 | 문화유산/기록 유산 |
| 유형 | 유물/유물(일반) |
| 지역 |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송광사안길 100[신평리 12] |
| 시대 | 조선/조선 |
| 집필자 | 이종수 |
| 제작 시기/일시 | 1577년 |
|---|---|
| 문화재 지정 일시 | 2016년 9월 1일 |
| 문화재 지정 일시 | 2021년 11월 19일 - 계초심학인문(언해) 목판 보물 재지정 |
| 현 소장처 | 순천 송광사 -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송광사안길 100[신평리 12] |
| 원소재지 | 순천 송광사 -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송광사안길 100[신평리 12] |
| 출토|발견지 | 순천 송광사 -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송광사안길 100[신평리 12] |
| 성격 | 목판 |
| 재질 | 나무 |
| 크기(높이,길이,너비) | 19.2~23.5㎝[높이]|69.3~75.7㎝[길이]|2.8㎝[너비] |
| 소유자 | 순천 송광사 |
| 관리자 | 순천 송광사 |
| 문화재 지정 번호 | 보물 |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송광사에 소장하고 있는 1577년 불교에 입문한 초심자들에게 교훈이 될 만한 승려의 글을 모아서 판각한 목판.
계초심학인문(언해) 목판은 보조국사(普照國師) 지눌(知訥)[1158~1210]의 「계초심학인문(誡初心學人文)」, 신라 원효(元曉)[617~686]의 「발심수행장(發心修行章)」, 고려 말 야운(野雲)의 「자경서(自警序)」를 차례로 언해하고, 이어서 사법어(四法語)로 일컬어지는 「환산정응선사시몽산법어(晥山正凝禪師示蒙山法語)」, 「동산숭장주송자행각법어(東山崇藏主送子行脚法語)」, 「몽산화상시중(蒙山和尙示衆)」, 「고담화상법어(古潭和尙法語)」를 배치하였다. 그 뒤에 「시각오선인법어(示覺悟禪人法語)」와 「몽산화상법어약록(蒙山和尙法語略錄)」을 함께 판각하였다. 목판은 총 45판이 현전(現傳)한다.
계초심학인문(언해) 목판은 전체 47판 중 45판이 전해지는데, 각 목판은 대략 세로 19.2~23.5㎝, 가로 69.3~75.7㎝, 두께 2.8㎝이다. 대부분의 목판은 양면에 판각하였고 광곽의 크기는 세로 18.4㎝, 가로 27.8㎝이다. 글자는 반곽 7행 15자로 원문을 새기고, 바로 이어서 한글 언해를 새겼다. 「자경서」가 끝나는 부분에 ‘만력오년정축하전나도순천지조계산송광사유판(萬曆五年丁丑夏全羅道順天地曹溪山松廣寺留板)’, 즉 “만력 5년 정축년(1577) 여름 전라도 순천 조계산 송광사에 목판을 보관한다.”라는 기록이 적혀 있다. 이를 통해 다른 곳에서 판각한 목판을 1577년(선조 10) 순천 송광사에서 보관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주지(住持) 극인(克仁), 간선화사(斡善化師) 계희(戒熙), 서(書) 정수(正修)·교희(敎熙)·도원(道元)이라는 인명이 보이므로 계희가 판각을 감독하고 정수 등 3명이 글씨를 썼음을 알 수 있다. 각수는 태준(太俊)과 숭인(崇印), 연판은 인관(印觀)이 맡았다.
명칭은 서지학의 관례에 따라 맨 처음에 나오는 제목인 ‘계초심학인문’을 대표 서명으로 삼았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계초심학인문’은 ‘초발심자경문(初發心自警文)’이라고 불린다. 여기에 실린 글들은 불교에 입문하여 아직 구족계를 받지 못한 사미승(沙彌僧)들이 공부하던 교재이다. 사미승을 교육할 목적으로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언해하여 판각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계초심학인문(언해) 목판은 현존하는 『초발심자경문』의 언해본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므로 초역(初譯)일 가능성이 있다. 2016년 9월 1일 보물 제1910호로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보물로 재지정되었다.
계초심학인문(언해) 목판이 간행된 16세기 후반은 불교 강원교육이 정착되어가던 시기이므로 『초발심자경문』의 판각은 강원교육의 정착에 이바지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 문화재청·불교문화재연구소, 『한국의 사찰문화재』-2014 전국사찰목판 일제조사, 전라남도2(송광사, 2015)
- 정우영, 「『초발심자경문언해』 연구」(『동악어문학』51, 동악어문학회, 2008)
- 손성필, 「16세기 송광사의 불서간행과 불교계 동향」(『보조사상』45, 보조사상연구원,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