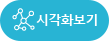| 항목 ID | GC07601140 |
|---|---|
| 영어공식명칭 | Gaeboreum Jinaegi(Seasonal Customs) |
| 영어음역 | Gaeboreum Jinaegi(Seasonal Customs) |
| 영어공식명칭 | Gaeboreum Jinaegi(Seasonal Customs) |
| 이칭/별칭 | 개 보름 쇠기 |
| 분야 | 생활·민속/민속 |
| 유형 | 의례/평생 의례와 세시 풍속 |
| 지역 | 전라남도 순천시 |
| 시대 | 현대/현대 |
| 집필자 | 한서희 |
전라남도 순천 지역에서 음력 정월 대보름날 개에게 밥을 주지 않는 세시풍속.
음력 정월 대보름에 개에게 밥을 주지 않는 풍속은 조선시대부터 전해져 오던 것으로 보인다. 『동국세시기』 상원 조에, “이날 개에게 음식을 주면 1년 내내 파리가 많이 꾀고 개가 쇠약해진다.”라고 하였으며, 유득공(柳得恭)[1749~1807]이 편찬한 『경도잡지(京都雜志)』에는 “이날만은 개를 먹이지 않는다. 개에게 먹을 것을 주면 파리가 많이 꾀고 마른다고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음력 정월 대보름날에는 개에게 밥을 주지 않는다. 정월 대보름에 개가 밥을 먹으면 개 몸에 부스럼이 생기며 파리가 끓고 살이 찌지 않게 된다고 한다. 순천시 낙안면 창녕리 가정마을에서도 과거에는 ‘개 보름 쇠기’를 했는데, 특히 이날 개에게 음식을 주면 개가 ‘비루[비리; 벼룩] 오른다.’라고 하여 절대로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 이처럼 정월 대보름날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개의 팔자를 빗대어 ‘개 보름 쇠듯 한다.’라거나 ‘보름날 개 팔자’라고 한다. 하지만 정월 대보름에 실제로 개가 온종일 굶는 것은 아니다. 정월 대보름에 아이들이 성씨가 다른 세 집에서 오곡밥을 얻어와 개집 앞에서 개와 함께 나눠 먹으면 그해 운수가 좋아진다고 믿는다거나, 보름날에 놓는 까마귀밥[까치밥]과 같이 정월 대보름에는 개가 먹을 것이 곳곳에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날만큼은 따로 먹을 것을 챙겨주지 않아도 무방했던 탓에 이와 같은 풍속이 생겨났을 것으로 보인다.
정월 대보름에 개에게 밥을 주지 않는 풍속은 개와 인간의 친숙성에서 기인한 행위로 볼 수 있다. 정초에는 다양한 액막이 행위를 통해 한 해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데, 개는 인간과 가장 가까운 동물이기에 가족들에게 행하듯이 그해 개의 건강을 위한 풍속이 개보름 지내기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날 개에게 밥을 주면 개의 몸에 파리가 끓고 토를 하며 살이 찌지 않게 된다고 여겨 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개를 위한 일 년의 액막이의 풍속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 『경도잡지(京都雜志)』
-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전라남도편(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69)
- 『전라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 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보름쇠기